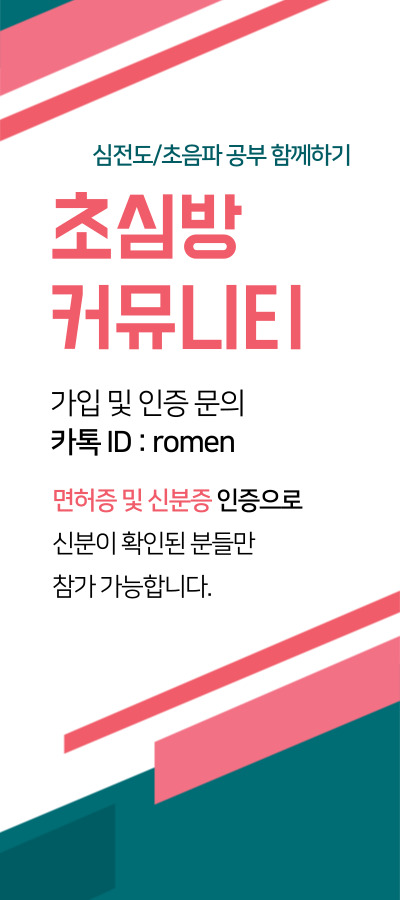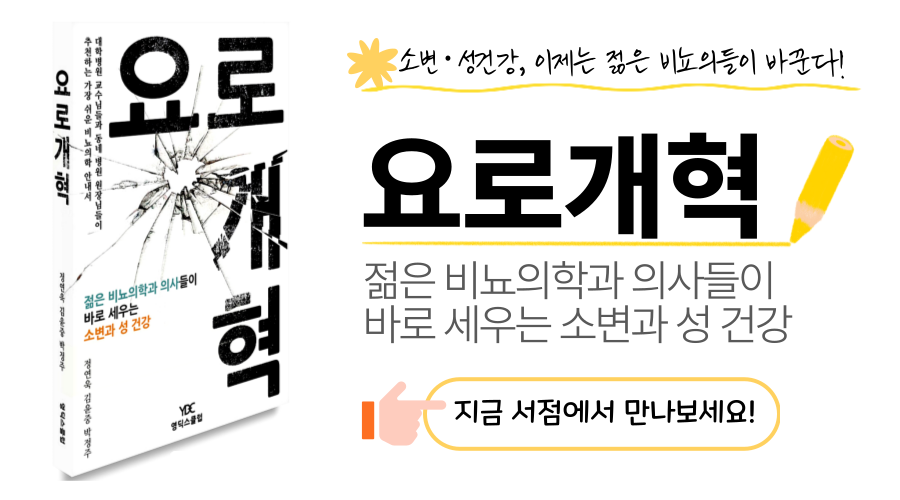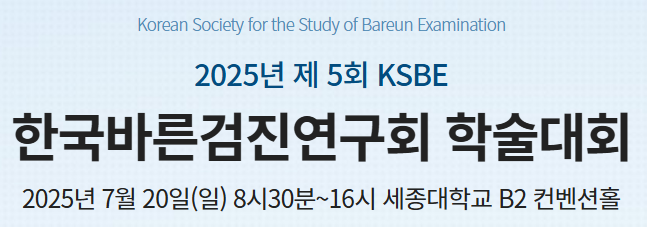보건의료노동자 4만명 실태조사 : 20분 교육받고 ‘의사 일’ 차출된 간호사
진료지원(PA)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직 등 진료지원인력 10명 중 4명은 교육을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1∼2월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한 ‘2025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한 4378명 중 43.9%가 ‘교육을 받지 못 했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더 많으나, (진료지원)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교육을 받지 못 했다는 비율은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의료원 진료지원인력은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72.2%로 높은 반면, 사립대병원은 47.8%가 ‘교육을 받지 못 했다’고 응답하는 등 사립대병원의 교육 공백 문제가 심각했다.
교육을 이수했더라도 40.4%는 ‘8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20시간’(18.5%), ‘21∼40시간’(17.4%) 순이었다. 10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다는 진료지원인력은 7.5%에 불과했다.
진료지원인력 38.5%는 ㄱ씨처럼 전공의의 대규모 사직이 시작된 지난해 2월22일 이후 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급하게 투입되면서 제대로 교육을 받기 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이비인후과)는 “전공의가 많았던 진료과는 전공의가 전부 사직한 뒤 부랴부랴 진료지원 간호사들을 병동에서 파견받다보니 손발이 맞지 않아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다. 지금도 익숙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진료지원인력들도 이전보다 업무의 위험도가 높고, 의지할 데가 없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진료지원 노동자 보호와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 40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최소 200시간의 교육시간을 구성해 예시로 제시한 바 있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진료지원 업무는 간호대학에서 배우지 않은 업무가 90% 이상이다. 교육시간이 80시간 밑이면 공통이론만 배우기에도 부족하고, 이론이 뒷받침 돼있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대처 역량을 기르기 어렵다”면서 “공통이론과 외과·내과·수술·응급·중증 교육을 포함해 최소 400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노동자의 90%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사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2월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한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보면, 간호사 등 보건의료 8개 직군 응답자 4만3560명 중 81.4%는 근무 중인 의료기관에 ‘의사가 부족하다’(매우 부족 39.1%, 다소 부족 42.3%)고 답했다. 지난 2023년 같은 설문(78.6%)에 견줘 2.8%포인트 올랐다. 보건의료노조가 1998년부터 해마다 진행하는 이 설문은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다룬 국내 조사 중 최대 규모다. 보건복지부도 정책 수립에 설문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립·사립대학 병원에서는 응답자 3만303명 중 89.6%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해, 2023년 조사(82.5%) 때보다 7.1%포인트 뛰었다. 반면 민간 중소규모 병원에선 이런 응답이 2023년 63.8%에서 올해 62.5%로 오히려 1.3%포인트 줄었다. 중소병원은 전공의를 두지 않아 인력 이탈이 적었던 데다, 대학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일부가 동네 병원에 취직하기도 하면서다.
의사 인력난은 보건의료 직역의 노동여건도 악화시켰다. 응답자의 49.2%는 ‘의사가 없어 의사 대신 면담·상담을 하고 환자·보호자의 항의를 듣는다’고 답했다. ‘의사 대신 처방을 한다’는 노동자는 35.5%, ‘의사 대신 시술·수술 동의서를 받는다’는 응답도 34.4%였다.
특히 ‘의사를 대신해 시술·드레싱(상처 소독)을 한다’는 응답은 간호사(49.9%) 외에 보건직(9.2%) 연구직(8.0%) 사무·행정직(6.2%) 중에서도 나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만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노동자의 29.5%는 ‘의료사고의 위험을 자주 느낀다’고 했다.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한 4239명 중 38.5%는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난해 2월22일 이후 업무에 배치됐다고 했다. 교육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43.9%가 ‘교육을 받지 못 했다’고 답했다. 교육을 받았더라도 40.4%는 교육 시간이 ‘8시간 이하’에 그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공청회에서 최소 200시간의 교육시간을 예시로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사직 전공의를 복귀시키는 조처만으론 대형병원들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으로 병원이 이전만큼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할 수 없고, 의대 증원으로 늘린 의사가 전문의로 배출되기까지는 약 10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체 의사 수가 늘어도, 병원이 남는 돈을 인력 채용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의료 현장에선 병원이 병상 수 대비 최소한의 의사 수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진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의료기관 종류별 환자 수 대비 의료인 인력을 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분은 시정명령 등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상위법인 의료법에 의료기관 종별 의료인 인력 기준과 위반 병원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자를 많이 볼수록 수가(진료비) 보상을 더 해주는 ‘행위별 수가제도’ 위주인 현행 보상체계를 고쳐, 의료기관이 의료진을 확보하는 데 대한 보상인 ‘인력 수가’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작성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하세요
-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